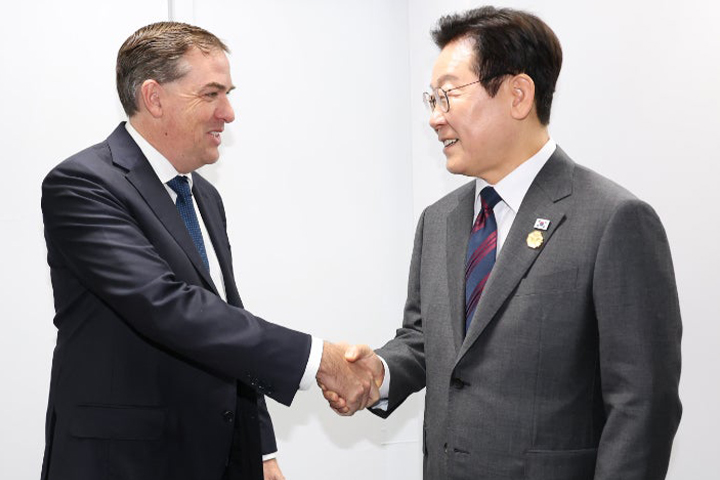BIZ
‘정년 60세 의무화’는 실패했다…한 교수의 작심 비판, 왜?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획일적인 연령 상향 조정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9일 주최한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에서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낳은 부작용을 지적하며, 고령층의 소득 공백 문제와 청년층의 고용 절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대안으로 재고용 모델이 집중 조명됐다. 이는 단순히 고령 근로자의 정년을 늘리는 방식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강제적인 법제화 대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고용 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획일적인 연령 상향 조정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9일 주최한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에서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낳은 부작용을 지적하며, 고령층의 소득 공백 문제와 청년층의 고용 절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대안으로 재고용 모델이 집중 조명됐다. 이는 단순히 고령 근로자의 정년을 늘리는 방식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강제적인 법제화 대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고용 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날 발제를 맡은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3년 도입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유발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가 고착화된 한국 노동 시장에서,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자 생존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고령층의 일자리 점유 기간만 늘렸을 뿐, 전체 일자리 파이를 키우지 못해 청년 세대의 희생을 강요한 셈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현실적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제시하며, 정부의 역할이 강제가 아닌 ‘유인책’ 제공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재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나 재고용된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등, 노사가 자발적으로 상생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와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 단체 대표들은 정년연장 논의가 결국 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고 미래를 담보로 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현재의 사회적 대화 구조에서는 기성세대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으며, 임금피크제와 같은 미봉책으로는 세대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들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채용부터 임금 체계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 전 과정에 걸친 ‘공정성’ 확보다. 기성세대의 소득 보장을 위해 청년 세대가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구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외침이다.
결국 정년연장 문제는 단순히 한 세대의 소득 문제를 넘어, 일할 기회의 공정한 배분과 보상의 합리성이라는 세대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과정이 핵심이다. 고령층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적으로 계속 활용하면서도,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정년연장이라는 손쉬운 해법 대신,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유연한 재고용 모델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세대 갈등을 넘어 세대 공존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